논어 제16편 계씨季氏(책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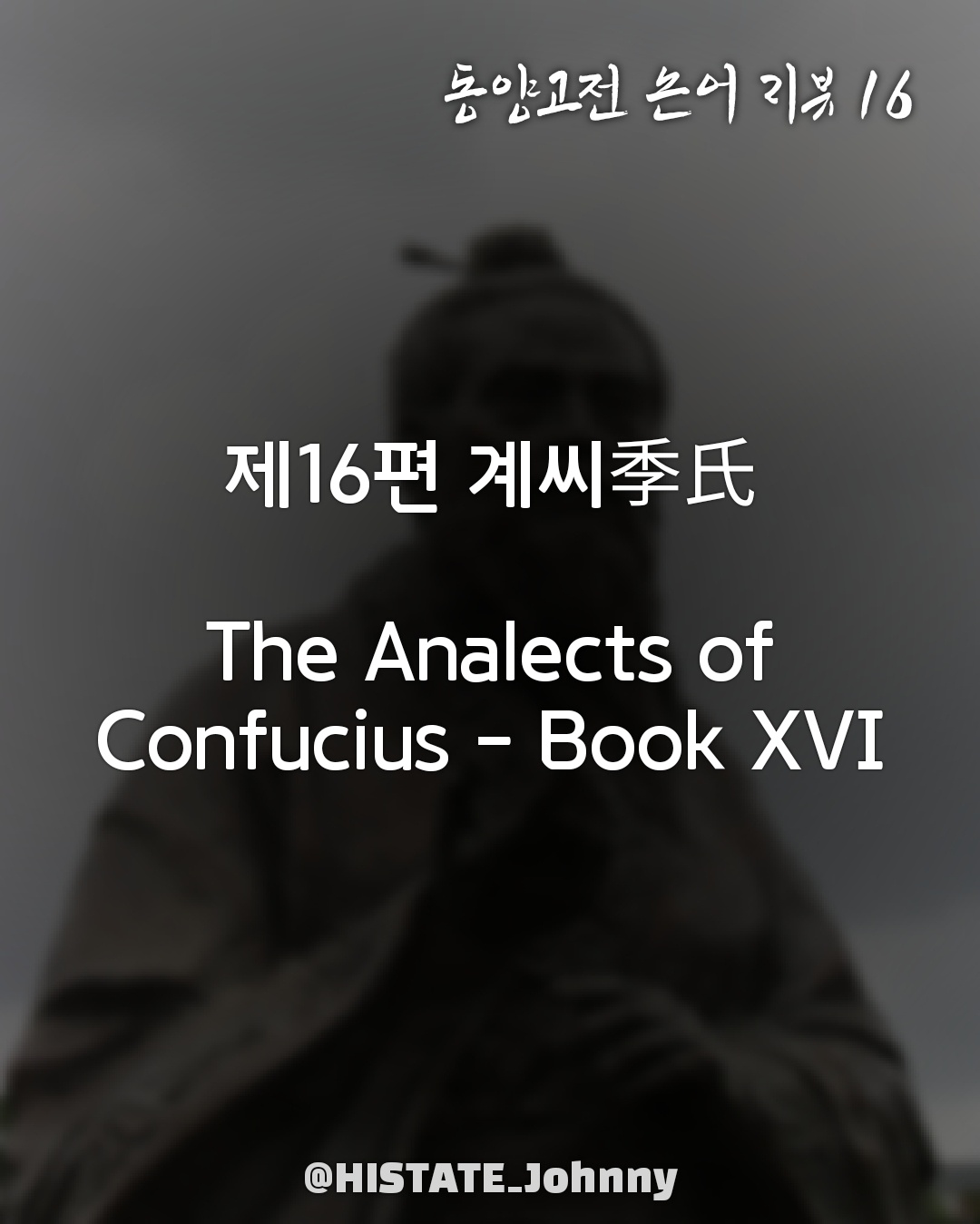
제16편 계씨季氏에서는 주로 삶에 있어서의 ‘처신’의 문제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교류’의 원칙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앞의 편들에 비해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내용이 짧고 비유적, 은유적 표현이 비교적 적어 이해하기가 수월하니 부담 없이 읽어 보면 좋을 것 같다.
4장 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이 셋이 있고, 해로운 벗이 셋이 있다. 정직한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위선적인 사람, 반대를 하지 않는 사람(아첨을 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Confucius said, There are three types of friends who improve you, and three types of friends who diminish you. Friends who are straightforward, sincere, and have learned much improve you. Friends who are fawning, insincere, and crafty in speech diminish you.
다른 부분은 쉽게 수긍이 가는데, 해로운 벗 중에 ‘반대를 하지 않는 사람’ 즉, ‘아첨을 잘하는 사람’은 해롭다는 말은 눈에 띈다. 제11편 선진先進 3장에서도 공자는 “안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구나.”라고 말하였고, 논어 전반에 걸쳐 공자의 이러한 생각은 여러 번 언급된다.
18세기 독일의 관념철학의 대표주자인 헤겔의 변증법에서 파생된 철학용어 중에 정반합(正反合, These, Antithese, Synthese)이라는 것이 있다. 철학용어라고 하면 우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 단순하게 설명하면, 기존에 인정되고 유지되어오던 ‘정’이라는 상태가 있고, 시간이 지나며 이를 부정하며 주장되는 ‘반’이라는 상태가 있다. 그리고 이 서로 모순되는 것들에서 버리고 취하여서 한층 발전된 형태인 ‘합’이라는 상태로 나아간다.
쉽게 말해 기존의 것‘正’들에 반하는 것‘反’이 나타나야 세상은 더 발전한 형태인 ‘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비단 철학뿐만 아니라 과학, 정치 심지어 예술의 역사까지 되짚어보면 모든 것들의 발전은 이 단계를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공자는 미처 이런 명제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나를 긍정해 주는 목소리는 늘 달콤하다. 그러나 그뿐이다. 물론 참된 칭찬이 듣는 이에게 의욕과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판 없는 맹목적인 찬동은 결국 상대방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된다.
9장 子曰. 生而知之者,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최상이고,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다음이며,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 배우는 사람은 또 그다음이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백성들 중에서도 최하이다.”
Confucius said, Those who are born knowing are the best; next are those who study and come to know it; next are those who study it only in circumstances of duress. Those who do not study it even under duress, they are the lowest of people.
제15편의 15장에 보면 공자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하며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도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다. 이 말은 곧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도 배우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주변을 둘러보면 가끔씩 정말 걱정과 고민만 주야장천 만들어내면서 아무것도 배우고 바꿔가지 않으려는 사람을 접하게 된다. 이런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정말 답답하다, 마치 주변을 마구 오염시키는 공장의 굴뚝과 같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댄다. 이런 사람을 보면 한마디 해주고 싶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스스로 노력해라. 힘들면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면 된다.” 참 쉽고 명쾌한 논리이다.
그런데 잠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자. 나는 온전히 이 논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는가?
스스로도 문제가 느껴질 만큼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땀 흘려 운동하기는 싫을 것이고, 팍팍한 현실에 지쳐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손에는 책보단 작고 가벼운 리모컨을 들고 싶을 것이다. 스스로는 ‘의지를 갖고 배우는 사람’, 혹인 ‘필요하면 배울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된다고 믿고 싶겠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믿음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까?
7장 子曰. 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旣衰, 戒之在得.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일이 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으므로 정욕情慾을 경계해야 한다. 장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막 왕성해지므로 다툼을 경계해야 한다. 노년이 되어서는 혈기가 쇠약해졌으므로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Confucius said, The junzi has three cautions. When he is young and his blood and energy are not yet settled, he is cautious about sex. When he is in his prime and his blood and energy have newly achieved strength, he is cautious about combativeness. When he is old and his blood and energy are declining, he is cautious about acquisitiveness.
10장 子曰. 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홉 가지가 있다. 볼 때에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에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몸가짐은 공손히 할 것을 생각하고, 말은 질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일할 때에는 정성스러울 것을 생각하고, 의심이 날 때에는 물어볼 것을 생각하고, 성이 날 때에는 뒤에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며, 이득 될 것을 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한다.“
Confucius said, The junzi focuses his attention in nine ways. In observation, he focuses on clarity; in listening, he focuses on acuity; in facial expression, he focuses on gentleness; in bearing, he focuses on reverence; in words, he focuses on loyalty; in affairs, he focuses on attentiveness; in doubt he focuses on questioning; in anger, he focuses on troublesome consequences; in opportunities to gain, he focuses on right.
'동양고전-다시보기 > 논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논어 제18편 미자微子(책리뷰) (0) | 2022.04.18 |
|---|---|
| 논어 제17편 양화陽貨(책리뷰) (0) | 2022.04.17 |
| 논어 제15편 위령공衛靈公(책리뷰) (0) | 2022.04.13 |
| 논어 제14편 헌문憲問(책리뷰) (0) | 2022.04.07 |
| 논어 제13편 자로子路(책리뷰) (0) | 2022.04.06 |




댓글